- 해연갤 - 일본연예
- 일본연예


1
사토 칸타는 본디 무시에 능했다. 어릴 적부터 외모만 보고 다가온 사람들에 질려서일 수도, 혹은 그저 타고난 천성일지도 몰랐다. 제 멋대로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겪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하여 다가오는 족속들. 그러다 자신의 상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곧바로 실망하고 돌아서는 인간들. 그런 이들을 겪으며 칸타는 성장했고, 팔다리가 길어지고 목이 굵어지는 동안 그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생겼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한 것. 그건 상처받지 않으려는 생존방식이자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유일한 장점이었다.
그런 칸타의 짙은 눈썹이 꽤 오랜만에 제 심기를 표현하듯 꿈틀댔다. 틀에 짜인 듯 촘촘하던 일상이 하나둘 박살 나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침범이었다. 주름진 미간 사이에서 냉기가 새어 나오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오노즈카는 제 일상에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들어왔다. 막 눈을 뜬 새끼 오리처럼 칸타를 졸졸 따라다녔으니까. 아니, 새끼 오리보다는 미꾸라지라고 해야 하나. 잔잔하던 마음의 표면이 진흙탕으로, 그것도 쉴 틈 없이 출렁대는 진흙탕이 되어버렸으니.
주위를 살피던 칸타가 이내 늘 앉던 자리로 향했다. 급식실 가장 끝 구석 자리, 큰 기둥이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탁, 하고 식판을 내려놓기 무섭게 제 맞은편 의자가 기다렸다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끌렸다. 보지 않아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자리가 그의 암묵적인 지정석이라는 건, 그리고 칸타가 아무에게나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는 건 1학년이라면 전부 알고 있을 테니까. 제 맞은편에 놓인 급식판의 음식은 딱 봐도 싸늘해 보였다. 식어빠진 밥을 입에 밀어넣으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눈앞의 사람은 온통 제가 질색하는 것 투성이다. 시끄럽고, 눈치 없고, 규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 좋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라고, 칸타는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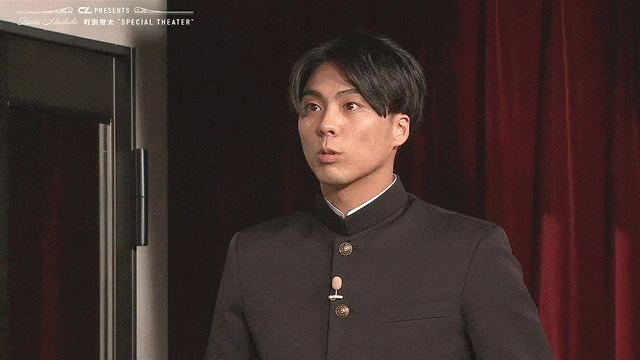
“너 돈까스 싫어해?”

“아뇨, 딱히.”
동그래진 눈을 한 오노즈카가 식판을 살피며 물었다. 반복되는 질문들. 대체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 이상을 넘기지 않았고, 지치지도 않는지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칸타의 취향을 물어오는 이 사람이 귀찮았다. 불퉁하게 대꾸하며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한 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오늘도 20분이나 늦었다. 원래대로였다면 산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갔을 시간이었다. 초조한 마음에 절로 다리가 떨려왔다. 반면 오노즈카는 태평한 얼굴로 열심히 돈까스를 썰고 있다. 확 두고 가버릴까. 이전의 칸타라면 지체없이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남자는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 투명한 얼굴이 문제였다. 저와는 정반대로 오노즈카의 마음은 얼굴에 위치한 듯했다. 지금도 봐. 얼굴에 ‘돈까스 나와서 기분 좋음’이라고 쓰여있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표정이 조금 재미있긴 했다.

“뭐가 그렇게 초조한데.”
작게 키득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난스레 발끝을 툭 하고 건드린 오노즈카가 제 몫의 요구르트를 건넸다. 저번에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 좋아하는 건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잖아. 눈을 꾹 감았다. 자꾸 동요하는 자신이 낯설었다. 주면서도 아쉬운지 입맛을 다시는 입매가, 그러면서도 얼른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듯 반짝이는 눈매가 칸타의 머리를, 그리고 마음을 이상하게 울려댔다. 속이 울렁였다. 좋지 않아. 정말로 이건 좋지 않았다. 오노즈카의 말과 표정이 자꾸만 칸타를 붙잡았다. 제가 멋대로 가버리면 울상이 될 얼굴을 떠올리기 싫었다. 이런 끈질긴 다정은 살면서 겪어본 적 없었고, 그래서 어찌해야 하는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다만 도망치는 수 밖에는.
그러니까 이건, 다 이 사람 잘못인거야.
***
오노즈카라고 쪽팔림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가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은 그걸 이겨낼 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더 많이 컸기 때문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9년 인생에 찾아온 첫사랑이었다. 사랑 타령하며 울부짖는 시꺼먼 제 친구 놈들을 신나게 비웃던 제 자신이 우스워질 만큼. 이 순간은 그에게 일생일대의 위기이자 기회였다. 저 싸가지 없는 후배 놈을, 그러나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저 예쁜 얼굴을 어찌해야 좋을까. 덕분에 오노즈카는 매일 밤 이불을 뻥뻥 차대고 베개를 적시고 그러다가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음이 나는 중증 상태에 이르렀다. 제 짝사랑 상대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단꿈에 빠진 채로.
난생처음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첫 키스를 할 때 울린다는 바로 그 종소리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보송한 향기, 제 몸통을 가릴 만큼 널찍한 어깨, 그리고 고개를 들자,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강렬한 아침 해와…. 칸타의 얼굴. 혹시 몸이 아니고 심장을 다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프게 요동치는 심장에 그는 겪어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다. 아, 이런 게 사랑인가 봐.
“야, 포기해. 쟤한테 고백했던 애들 다 울면서 차였대.”
그런 오노즈카를 말린 친구만 벌써 몇 명째더라. 하지만 단단히 사랑에 빠진 남자의 귀에 충고 따위가 들릴 리 없다. 포기하기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릴 마음을 숨길 수도 없었으며, 애초에 이 정도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한 칸타는 소문만큼 잔혹하지 못했는걸.
오노즈카에게 칸타는 언제나 쉽게 읽혔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무르고, 강해 보이면서도 약한 사람이었다. 제 여린 살을 들키고 싶지 않아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고 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눈으로 좇고 있는걸. 애정이 있다면 모를 수가 없다. 그는 대체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말을 걸면 세상 귀찮다는 표정을 하면서도 착실하게 답해주고,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물론 정신없이 다리를 떨어대긴 하지만. 얼핏 보면 무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눈빛은 온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눈썹의 미묘한 방향을, 입꼬리의 위치를 오노즈카는 읽어낼 수 있었다. 가끔 드물게 말려 올라가는 입꼬리가 어쩌다 주어지는 포상 같아 오노즈카는 그 앞에서 자주 우스워졌다.
***
“...기다렸어요?”
급하게 나온 건지 답지않게 머리에 까치집을 지은 칸타의 눈썹이 오노즈카를 살피는 듯 조심히 호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귀여워. 당장 저 머리칼을 흩트려주고 싶다. 이 귀여움을 저만 아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자꾸만 오노즈카를 취하게 만들었다. 배실배실 감출 생각도 없는 미소가 새어 나왔다. 칸타와 함께 등교하게 된 지도 어느덧 2주째였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있다고, 그때의 오노즈카는 생각했다.
칸타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