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연갤 - 일본연예
- 일본연예

https://hygall.com/556423515
view 4691
2023.07.31 16:06
https://hygall.com/553428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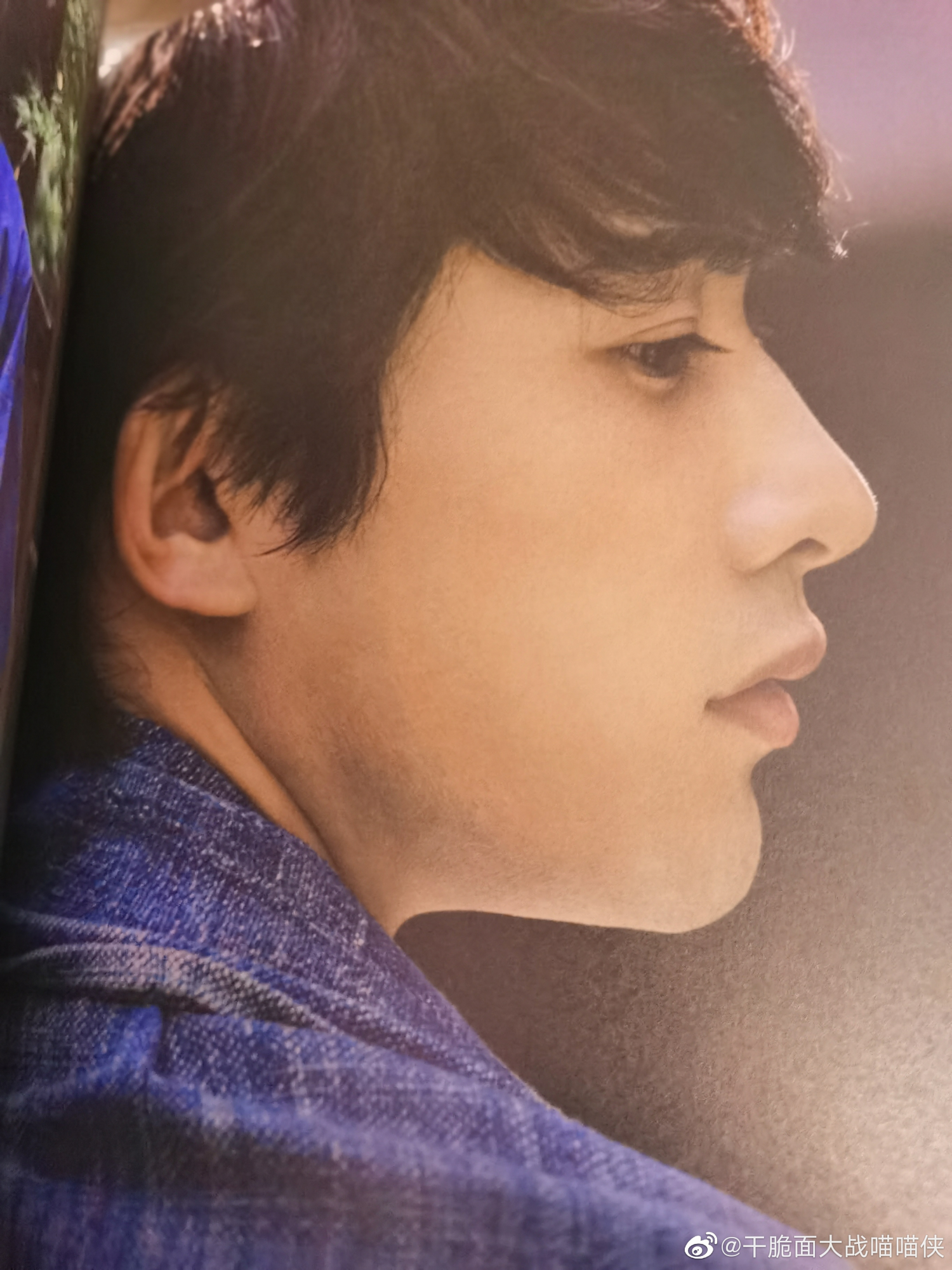

*
다행히 비는 점차 멎어갔다. 고용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에 있었고 노부만 정원에 나와 있었다. 마치다가 뛰쳐나간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깟 고양이 새끼가 뭐라고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씻으시라는 고용인의 말에 노부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가서 찾아와. 똑같이 생긴 다른 고양이 새끼라도 구해 오던지. 그 전엔 돌아오지 마.” 애초에 고양이를 숨긴 곳을 알고 있기에 무리일 것 없는 명령이었지만 기다렸다는 듯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여서 고용인을 망설였다. 일단은 대문을 나서 고양이를 찾는 척 동네 한 바퀴 돌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성가셔 정말. 도대체 왜 도둑고양이를 들여서.” 뒤에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휙 돌려 보니 노부가 서 있었다. “아... 그, 그냥 집에 계시지 왜... 빗길이라 미끄럽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의도도 없이 노부는 고용인을 정면으로 노려봤다. 이 집에 마치다가 들어온 뒤로 고용인들의 분위기가 바뀐 걸 알고 있었다. 기분 나쁜 정적과 묘한 질투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요즘 가장 아끼는 고양이를 일부러 내다 버리다니. 고용인은 끝까지 창고 안에 고양이를 가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노부 손에 이끌려 창고 문을 열어야 했다.
*
마치다는 마을 입구에 있는 수풀까지 갔다가 그냥 바닥에 풀썩 앉아 버렸다. 내가 얼마나 귀여워했는데. 아무리 숨는 걸 좋아한다지만 주인이 이렇게까지 찾으러 다니면 얼굴 좀 내밀어 줘야지. 비에 젖은 옷이 마를 틈도 없이 다시 빗방울이 떨어졌다. 춥고 배고프고 상실감이 컸다. 이 마을로 와서 처음 마음을 준 존재였는데. 소금이 덕분에 요즘 집안 분위기도 좋았는데.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소금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뺨까지 때리고 나온 결과가 이런 거라니. 소금이라도 찾게 된다면 외롭지 않을 텐데. 나무 밑으로 이동해 지친 몸을 기댔다. 안 그래도 약한 몸으로 비까지 맞으며 돌아다녔더니 기운이 쏙 빠졌다. 무릎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묻었다.
*
먁! 꿈에서 소금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눈에 보이진 않았다. 먁...! 이번엔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정신을 차리니 주변이 캄캄했고 쪼그려 앉은 발 앞에 거짓말처럼 소금이가 앉아 있었다. “소금!”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노부가 새 옷을 들고 서 있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면 어떡해요. 찾느라 애먹었네.” 절대 집 밖에 나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뺨까지 쳐올리고 나왔단 사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치다는 고개를 숙였다. 할 수 있는 건 떨리는 손으로 소금이의 작은 머리통을 긁어주는 것뿐이었다. “옷 젖어서 감기 걸리겠어요. 일어나서 이거 입어요.” 노부는 손을 내밀어 마치다를 일으켰고 입고 있는 유카타를 벗겼다. 아무리 캄캄해도 야외에서 옷을 벗는 건 몹시 부끄러웠지만 남편의 손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 몸으로 가려줄 테니까 얼른 입어요. 집까지 돌아가면서 감기 걸리지 않으려면.” 마치다는 노부 앞에 바짝 붙어 서서 새 유카타에 팔을 끼웠다. 누구에게도 제 부인을 내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야외 풀숲에서 옷을 벗기다니, 마치다는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소유욕이었다. 젖은 옷을 손수 들고 앞장서니 마치다가 소금이를 안고 쭈뼛쭈뼛 뒤따랐다. “여보... 아까 때린 거... 미안해요... 제가 순간 너무 흥분해서...” 뒤를 슬쩍 돌아보는 노부 얼굴에 분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
밤이긴 해도 고용인들은 남은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기에 이렇게까지 조용한 게 어색했다. “오늘은 다들 일찍 자나 봐요...” 소금이를 씻기기 위해 욕실로 향하는 마치다의 옷을 또 벗기는 노부였다. “이놈 씻기기 전에 부부관계부터 합시다. 종일 같이 있을 시간도 없었는데.” 방도 아니고 욕실 안도 아니고, 욕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가랑이 사이로 성기를 밀어 넣었다. 건조한 속살을 뚫고 들어오는 양물에 마치다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점점 주저 앉게 됐다. 노부가 소금이를 한 손으로 가뿐히 들어 바닥에 내려놨고 주저앉고 있는 부인의 몸을 자기 하체로 받쳤다. “여기에서 이러면... 안 돼요 여보... 방으로 가요 제발...” 빗물과 땀으로 끈적이는 목덜미를 깨물며 노부가 작게 속삭였다. “아무도 없어요. 이 집에 당신과 나뿐이에요. 그러니 복도에서든 부엌에서든 짐승처럼 붙어먹어도 아무도 안 봅니다.” 등에 벽지가 쓸리는 느낌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 마치다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마주 선 채 아랫배를 맞댄 남편의 몸을 바라보며 착실히 아래를 적셔갔다. “흣... 여, 여보...” 의도하지 않았는데 허벅지와 종아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물 너무 흘리지 마요. 내일 아침까지는 청소할 사람 없으니까.” 소금이는 소파 위로 자리를 옮겨 스스로의 몸을 핥아 정돈했다.
*
스즈키 저택에서 고용인 일곱 명을 새로 뽑는다는 말에 옆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면접을 당연히 사모님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봐서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이 집 사모님은 밤새 남편 양물에 시달려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는 걸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일단은 세 명을 뽑았어요. 오늘 오후에 짐을 들고 들어올 거예요. 인사는 천천히 하고, 오늘은 일단 쉬어요.” 노부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마치다의 몸을 닦아주면서, 온몸에 울긋불긋한 자국들을 눈으로 맛봤다. “아직도 앉기 불편해요? 저녁은 먹을 수 있겠죠. 소금이랑 놀고 있어요. 난 면접 볼 사람이 더 남아서.” 마치다에게 짧게 키스하고 침실을 나간 노부는 제 부인에게서 풍기는 야한 냄새에 아랫도리가 뻐근해졌다. 소금이가 문틈으로 머리를 넣고 들어오는 모습에 마치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다. 목부터 발목까지 민망한 자국이 가득했다. 아래는 아직도 부어있고 아예 빠져 버릴 것 같은 불쾌한 통증이 있었다. “이런 꼴로 어떻게 인사를 나누라는 거야...” 새로운 고용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뻔해 벌써 낯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마치다의 생각과 달리 새 고용인들은 과할 정도로 순종적이고 모든 것을 보고도 입을 꾹 다무는 이들이었다. 앞으로 스즈키 저택의 일상은, 야릇하고 다소 변태적인 집주인과 사모님의 잠자리 소문은 대문 밖으로 새어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노부마치
https://hygall.com/556423515
[Code: 0681]
